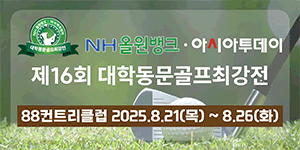인사·예산권 한계 뚜렷
|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7월 전면 도입돼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를 지휘·감독하는 구조다. 시행 4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 설계와 현장 운영 간의 괴리는 뚜렷하다.
대표적인 문제는 지휘 체계의 이원화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여전히 경찰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자치경찰위가 직접 지휘하기 어렵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치안 현장인 지구대와 파출소도 국가경찰 소속으로 편제돼 있어 자치경찰위의 관할 밖에 있다.
예산과 인사권의 부재도 문제로 꼽힌다. 자치경찰위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관련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자치경찰위가 무언가 하려고 해도 예산도 없고 인사권도 없어 한계가 크다"며 "결국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위는 사실상 '자문기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자치경찰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유일한 지역이지만, 국가경찰 소속 자치경찰과 병행 투입되면서 오히려 업무 중복과 지휘 혼선이 잦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할 경우 지자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존재한다. 자치경찰관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유지한 것도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개혁 방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맞물려 자치경찰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