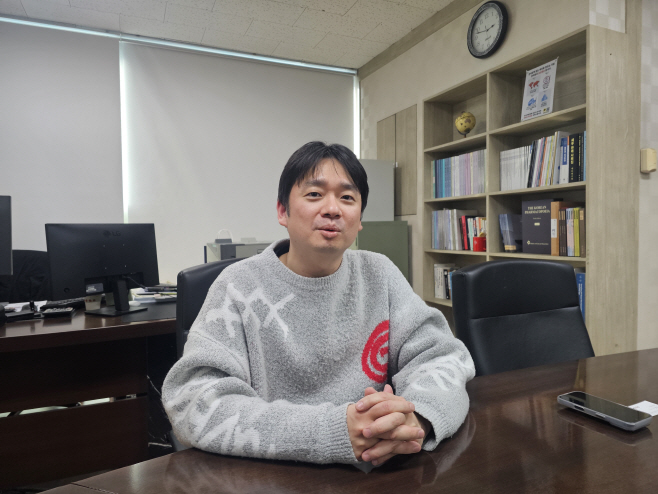"몇 시에 앉아 있었느냐보다 결과가 더 중요"
육아기 단축근로에 시차출퇴근 결합
야근은 사전 결재로 관리
|
지난달 29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번역 전문 기업 프로랭스에서 만난 권영조 대표는 회사의 유연근무 운영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1988년 설립된 장수기업이지만, 근무 방식만큼은 어느 스타트업 못지않게 유연하다.
프로랭스는 육아기 직원이 늘었던 시기를 계기로 근무시간 운영 방식을 조정했다. 권 대표는 "특정 시기에 육아기 직원이 한꺼번에 많았는데, 이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시차출퇴근제를 접목해 각자의 육아 루틴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덕분에 프로랭스 사무실의 오후 2~3시는 누군가에게는 업무 몰입 시간이고, 하원을 맡은 직원에게는 '당당한 퇴근 시간'이 된다. 오전 7~8시에 조기 출근해 업무를 일찍 마친 뒤 아이를 맞이하러 가는 풍경은 이곳에서 낯설지 않다. 단순히 시간을 줄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육아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회사가 근무 스케줄을 함께 설계한 결과다. 권 대표는 "출근 시간이 다르면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번역 업무는 오히려 결과로 평가하기 쉬운 일"이라며 "몇 시에 앉아 있었느냐보다 언제, 어떤 품질의 결과물이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시간 활용은 야근 관리와 함께 작동하며 일·생활 균형의 기반이 된다. 프로랭스는 불가피한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팀장과 임원, 대표까지 이어지는 사전 결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권 대표는 "유연근무로 일찍 퇴근하더라도 야근이 잦아지면 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구호로 야근을 줄이기보다, 야근이 쉽게 선택되지 않도록 절차를 두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번역 업무의 핵심이 결국 사람에 있다는 경영 철학은 회사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 법정 주 5일제가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주 5일 근무를 도입했던 경험이 지금의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밑바탕이 됐다. 권 대표는 "직원들이 삶의 균형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고객사에도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과는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체 직원의 91% 이상이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이직률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숙련 인력이 육아기를 지나며 조직에 남아 평균 근속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권 대표는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을 수단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선"이라며 "대표가 먼저 직원의 행복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믿을 때 근무 혁신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