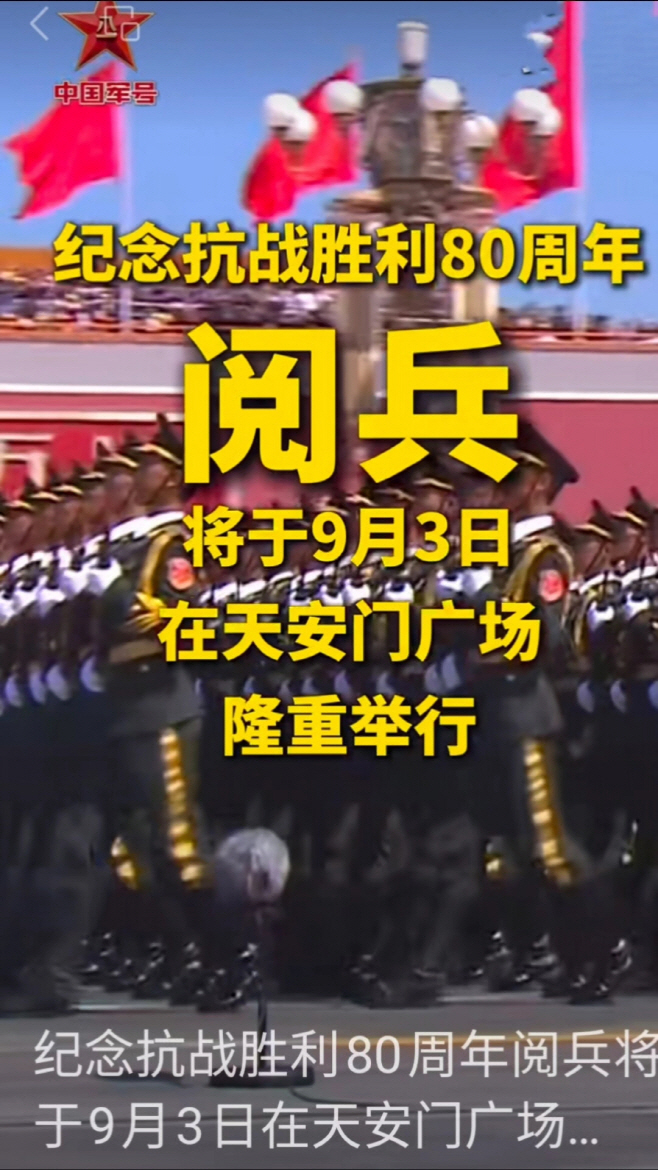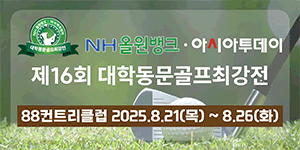가능성도 꽤 높은 것이 현실
김정은 위원장 행보도 주목
|
동북아 정세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일 전언에 따르면 이렇게 전망되는 이유는 많다. 우선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무려 1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이제는 그만 화해를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낀 중국이 이 대통령 초청이라는 카드를 누구라도 감지 가능할 정도로 검토하는 자세를 보이기 무섭게 한국도 바로 호응하게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듯하다.
1일 새 정부 들어 1개월 만에 양국 외교부 아주국장 협의가 한국에서 열린 사실 역시 심상치 않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겠냐는 분석을 하게 만들 만한 회동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관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 L 모씨가 "양국 관계는 다소 껄끄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양국 외교부의 아주국장이 만났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전향적으로 논의됐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역시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더 이상 중국과 껄끄러운 상태를 유지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한국의 절박함도 거론해야 할 것 같다. 뭔가 관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전승절 초청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신호를 먼저 보냈으니 꽤 긍정적인 화답을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당연한 말이겠으되 이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을 현실로 확정지으려면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의 과제로 삼는 미국이 보낼 수밖에 없는 의혹의 눈길을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한반도 중심의 지역 및 국제 정세 등도 두루 검토하지 않아도 곤란하다.
국내에 만연한 반중 정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상당수 국민들의 동의 없이 서둘러 전승절 참석을 결정했다가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는 곧 임명될 총리의 대리 참석을 통해 중국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연초에 참석을 확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장에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단언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